축구를 하다 다쳐 발목이 후끈 부어오른 날이면
차가운 얼음팩으로 냉찜질을 하곤 했다.
숙제를 안해 선생님께 맞아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날이면
차가운 책상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덜어내곤 했다.
생각이 많아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이면
찬물로 세수하며 잡념을 흘려보내곤 했다.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팬티속이 후끈 달아오른 날이면
차갑게 식은 내 손을 건네곤 했다.
인생의 추위 속에 꽃핀 작은 따뜻함 조차도
곧장 식혀버리지 않으면
그 외로움에 내 전부가 파묻힐 것만 같았다.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이 차가움과 맞닿아 얼어붙을것만 같았다.
그랬다.
그런데..
그런데, 이 팬티속에 있던 슬픔이란 녀석은
끝없이 달아올라 기어코 슬픔을 녹여내고 만다
아무리 달래고 달래보아도,
초연함 뒤에 다시 찾아오는 외로움은
생명의 퍼즐조각을 끼워넣고 싶은 인간행태의 본능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만성질환인가.
이 맑디 맑은 순백의 영혼들은
인생의 시작을 불어넣을 생명의 영혼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병마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열병과 싸우며
지쳐쓰러진 백골의 영혼들인가.
그래,
이것은 병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평생 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보같은 짓을 되풀이 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도 뜨겁게 흩뿌려진 백혈구의 잔해를 닦아내며...
팬티에 묻는다.
이것이 외로움의 마지막 무덤이길 바라며
팬티에 묻는다.
미쳐 흐르지 못한 나이팅게일의 하얀 피가 팬티를 적셔온다.
팬티에 묻는다.
무덤 위로 코끝까지 사무치는 이 외로움의 향기는
언제쯤이면 끝이나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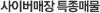









































0/2000자